예스24에서 딱히 사려고 했던건 아니지만 광고문구를 보고 냉큼 주문을 했던 책이다.
생각보다 부피가 얇아서 조금 실망?도 했지만 겉표지에 나온 작가의 얼굴은 광고에서만큼이나 잘생긴 청년임에는 틀림없었다.
약력을 보아하니 심상치 않은 젊은이임에 틀림없다.
노통여사와 함께 젤러씨(79년생이니 우리나이로 해도 이제 겨우 28살?인가) 눈여겨 볼 프랑스의 젊은 작가인듯 하다.
사실은 소설속 남자주인공의 얼굴이 책표지의 작가얼굴로 상상이 될만큼이나 소설속 주인공과 왠지모르게 비슷한 느낌이다.
대표적인 남녀의 연애심리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가는 자신을 조여오는 굴레가 될것이라는 일종의 비관적 연애관을 가진 특별한 남자, 트리스탕과, 항상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쩌면 여자의 대표적 성격을 보여주는, 끝없이 사랑에 빠진 자신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자주인공 아멜리의 사랑이야기다.
쉽게 술술읽혀지지 않을만큼 약간은 어렵고 꼬인 문장들과 냉소적인 문체때문에 더욱 매력있는 소설인듯하다.
트리스탕처럼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결국엔 서로 미워하게 될것이라는 연애관 혹은 사랑관을 가진 남자들이..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남자일까?
아니면 극소수일까?
ⓒ음냐리
그 후 그는 만나는 여자들이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처신했다. 모든 감정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만이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병적인 허기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삶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쾌락 그리고 모호한 약속들을 모두 먹어 치움으로써 거덜 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p.17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역사의 시작은 종종 마법과 같은 양상을 띤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런 이유로 그 시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상호적인 역할이 명백해지며, 힘의 관계가 자리를 잡고, 연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이 맺어지면서 훗날 그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등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고착돼 버리기 때문이다. --- p.24
트리스탕이 아멜리를 만난 것도 그런 식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통속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어느 날, 거리에서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 이후 그의 삶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곤 한다. 자신이 그녀 곁에 머물면서 놓치게 되는 모든 것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자들에게 보내는 시선 속에는 관광객의 시선처럼 바로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 p.33
때로는 자신의 매우 어두운 부분, 죽이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과도한 폭력성이 엿보이는 자신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충동들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폭력성에 의해 스스로가 고양되기도 한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그의 벨벳같이 부드러운 은밀함 속에서가 아니라 흐느낌과 굴욕으로 황폐해진 극한 상황 속에서라고. --- p.79
그 후에도 그때와 똑같은 추락, 사라져 버리기의 욕구를 느낀 적이 있었다. 마치 끊임없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럼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하는 행위도 그와 다를 게 무어란 말인가. --- p.88
슬픔이 몰려왔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시들고, 썩어 버리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았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도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작은 아무 의미도 없다. 시작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린다. --- p.118
'우월한 존재들은 고독한 법이야.' 트리스탕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예전에 원하던 모습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웅적이기를, 숭고한 삶이 되기를 바랐지만, 보잘것없는 목표와 쓸데없는 까다로움, 하찮은 쾌락들을 좇으며 삶의 초반부를 망쳐버렸다. 위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을 위해서도 자신을 불태울 줄 알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랐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대하고 고귀하며 굳건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빠져 들지 말고 하찮음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면서, 하나의 절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줄도 알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그는 미적지근한 과에 속하는 존재임이 명백하다.---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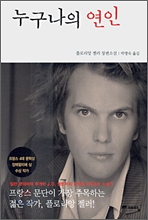
누구나의 연인
플로리앙 젤러/박명숙옮김/예담/175P
'행간을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중그네, 아내가 결혼했다. (1) | 2007.05.16 |
|---|---|
| 남쪽으로 튀어 (3) | 2007.04.11 |
| 달콤한 나의 도시 (1) | 2006.12.28 |
| 소설 정약용 살인사건 (0) | 2006.11.14 |
| 살아간다는 것 (2) | 2006.08.06 |
| 고모는 ...... 위선자들 싫어하지 않아 (3) | 2006.05.22 |



